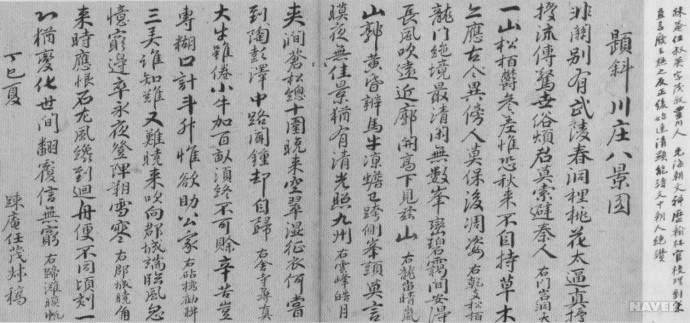9. 안무 차 함경도로 나가는 유천 한상국에게 봉송하다. (1610년 9월)
(奉送柳川韓相國出按咸鏡道)
尙書初辭大執法,
旋着武侯單白袷.
盡付關北二十州,
要試胸中十萬甲.
상서는 막 대사헌직을 사임하고
돌아서서 제갈무후의 단백겹을 입었구나.
관북 20주를 남김없이 부탁받았으니
흉중의 십만 갑병을 시험해 보겠네.
-문두의 要는 어떻게 새겨야 하나?
-武侯單白袷: 제갈량이 군대를 지휘할 때 늘 단백겹을 입었다는 고사를 본 것 같은데 전거가 기억이 안 남.
-이 시기에 관북이 실제로 20주였나?
王念北方豐沛鄕,
比年孼虜恣蹈梁,
千人百人纔擊刺,
十城九城俱逋亡.
임금께서 북방의 풍패향(제왕의 고향)을 생각하시니
최근 되놈들이 함부로 날뛰고 노략질해서이지.
천명 백명이 겨우 공격해 놓으면
열 개 성, 아홉 개 성은 모두 도망쳐 버리네 (주체는 누구?)
--豐沛: 함흥(咸興)이 전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터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풍패(豐沛)’는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인 패현(沛縣) 풍읍(豐邑)으로, 전하여 제왕(帝王)의 고향을 지칭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본관이 전주이고 그 선조가 함경도 함흥 등지에 살았기 때문에 함흥과 그 일대 및 전주 지방을 풍패지향(豐沛之鄕)이라 일컫는다. 여기서는 함흥을 가리킨다. 신임 감사의 도계를 하례하여 올린 계사〔新監司到界賀上啓〕 | 지봉집(芝峯集)
以此戰守渠豈敢,
髦倪實恐胡來噉.
王恢縱詘馬邑謀, [暗用安國事]
忠獻可寒西賊膽.
이런 식의 공격과 수비로 제 어찌 감히 나서겠나
노약자들은 실로 오랑캐들 와서 해먹을까 근심하네.
왕희는 비록 마읍의 꾀에 굴했지만 [암암리에 김안국(?)의 사실을 인용한 것]
충헌은 서하 오랑캐의 담을 서늘케 하였네.
-왕회: 왕회는 연(燕) 출신으로, 오랑캐의 일에 대해 잘 알았는데, 당시에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를 자주 괴롭히므로 무제가 이에 대한 방책을 묻자, 왕회가 “흉노는 맹약해 놓고 몇 해 안 가 곧 다시 배신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쳐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 계책이 채용되어 30만의 군대를 마읍(馬邑) 골짜기에 정돈하고 선우를 유인하여 습격하려 하였는데, 선우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왕회는 진격하지 않았다는 죄를 받고 하옥되어 죽었다. 《漢書 卷6 武帝本紀》 전억석가 〔前憶昔歌〕, 동명집(東溟集) 권9 각주.
-충헌: 송나라 명신 한기(韓琦)의 시호. 일찍이 서하(西夏)가 배반하자, 한기가 섬서경략안무초토사(陝西經略按撫招討使)가 되어 평정하였다. 서적(西賊)은 곧 서하를 뜻한다.
制下西垣輿誦同,
眼前久已無山戎.
翥鶻團袍疊椹紫,
明虹鏐帶園花紅.
서쪽 변방에 제서(制書) 내리는 데에는 여론이 같았고
안전에는 산융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
자골(翥鶻)의 단포(團袍)에는 자심이 첩을 짓고 (무관의 복식을 묘사한 듯?)
무지개 서린 금대엔 붉은 꽃이 빙 둘렀네.
-西垣: ①당송 시대 중서성의 별칭. 궁궐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 ②서쪽 성.
-山戎: 고대 북방 민족의 이름. (주로 하북성 거주)
犀弓鐵鎧環精猛,
直擣王庭熄邊警.
殺氣霜凋蓋馬山,
軍聲雷動先春嶺.
무소 뿔로 만든 활과 철갑 옷 입은 정련된 군사를 대동하고
단숨에 왕정을 공격하여 변방의 경계거리를 없애리라.
살기는 서릿발저처럼 개마산을 얼리겠고
군대의 소리는 우레처럼 선춘령을 뒤흔들리라.
佇看狐鼠攝威弧,
留犁服匿爭來趨.
若置 [一作固] 臨邊三大鎭,
何難解瓣五單于.
여우와 쥐떼 위엄 서린 활에 떨어 피할 곳 찾겠고
유리(숟가락) 복닉(술그릇) 앞다퉈 달려와 붙좇겠네.
만약 변방에 세 개의 큰 진을 설치한다면
다섯 선우를 해산하여 다스리기 뭐 어렵겠나.
-유리복닉: 유리는 흉노 선우가 쓰던 밥숟갈, 복닉은 흉노의 술그릇
-五單于: 월사집, 동명집에도 언급됨. 호한야(呼韓邪)ㆍ도기(屠耆)ㆍ호게(呼揭)ㆍ거리(車犁)ㆍ오자(烏藉)의 다섯 선우가 있다. (월사집 이상하 선생의 주석)
安攘大計在劈畫,
況是扶顚富籌策.
刷恥終豎執平旗,
勒功須鑱尹瓘石.
백성을 안정시키고 오랑캐를 물리칠 큰 계획과 모략 있으니
하물며 [변방] 보전할 계책이 풍부함에랴.
치욕 씻어 마침내 집평기를 꽂겠고 (?)
윤관의 돌에 그대의 공을 새기게 되리.
-安攘: 환난을 없에고 천하를 안정시킴.
-劈畫: 劈劃. 모략.
我衣之華誰置憂,
貂蟬自古出兜鍪.
二十四考待追郭,
萬八千戶行封留.
내 옷 빛남이여 누가 근심하겠나.
초선(고관의 의복)은 자고로 도무(장수의 투구)에서 나온다네.
스물 네 번 고시를 주관한 곽자의의 공적을 따르리니
장차 만 팔천호의 유후에 봉해지리라.
-곽자의가 중서령으로 고시를 24회 주관한 것을 말한다.
-장량이 유후에 봉해진 것인데, 확실치 않으나 유 땅이 1만 8천호였던 듯하다. (신호열 주석)
野夫早識荊州面,
人生安得長相見.
北風吹髮日西沈,
眼斷關雲淚如線
야인들은 일찍이 형주의 얼굴을 알았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어찌 길게 서로 볼 수 있겠는가.
북녘 바람 불어오고 서산에 해 지니
관산 구름 아스라 하여 눈물이 실처럼 흐르도다.
-형주의 얼굴을 알다: 이백(李白)이 일찍이 자기를 천거해 달라는 뜻으로 당시 형주 자사(荊州刺史)로 있던 한조종(韓朝宗)에게 보낸 편지에 “제가 듣건대 천하의 담론하는 선비들이 서로 모여서 말하기를 ‘태어나서 만호후에 봉해지기는 굳이 원치 않고 다만 한 형주를 한 번 알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합니다.〔白聞天下談士相聚而言曰 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古文眞寶 卷2 與韓荊州書》
*한준겸(1557~1627)
본관은 청주. 자는 익지(益之), 호는 유천(柳川). 인조의 장인. 1580년 별시 문과에 장원.
1610년 8월 18일에 대사헌으로 임명됨. 9월 18일에 함경 관찰사에 임명됨. 실록에는 “인품은 별로 볼 것 없다(原人無足觀)”는 기록이 있음.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발각되자, 정여립의 생질인 이진길(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연좌되어 투옥. 1595년 유성룡의 종사관이 되었다. 1597년 좌부승지에 올라 명나라 도독 마귀(麻貴)를 도와 마초와 함께 병량의 보급에 힘썼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자 우승지·경기감사·대사성 등을 거쳐, 다음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정인홍과의 알력으로 파직당하였다. 그 뒤 대사헌·한성부판윤 및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특히, 함경도관찰사로 있을 때는 『소학』·『가례』 등의 책을 간행, 보급해 학문을 진흥시켰다.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전리방귀(田里放歸)되고, 1617년 충주에 부처되었으며, 1621년 여주에 이배(移配)되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그의 딸이 인열왕후(仁烈王后)로 책봉